청록빛 의자
엄마가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매일 엄마의 빈 자리를 보는 어머니를 생각한다.
어머니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목양실. 목양실은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고, 교인과 상담하는 공간이다. 설교를 준비하는 책상 맞은편, 그리고 어머니가 즐겨 앉는 소파 맞은편에 장독대만 한 청록빛깔 헝겊 의자가 우두커니 서 있다. 어머니는 날마다 의자를 스치고 바라본다, 외할머니가 앉으셨던 조그만 의자를.
나 역시, 매주 어머니의 목양실에 들어설 때마다 청록빛 의자와 마주한다. 의자를 볼 때마다 떠오른다, 우리 외할머니. 어머니는 교회 전도사로 일하느라 할머니에게 어린 나를 맡기는 일이 잦았다. ‘외할머니’ 하면 맨 먼저 백김치가 떠 오른다. 뻘건 배추김치 못 먹는 손주를 위해 입으로 쭉 빨아 만들어 주시던 백김치.
밥 먹기 싫다고 징그럽게 울어 젖히는 손주에게 한 번도 큰 소리 내지 않고, 늘 허허허 웃던 할머니. 머슴밥 한 숟가락 위에 달걀후라이, 멸치, 백김치 올려서 술래잡기하듯 도망가는 손주 쫓아다니며 밥 먹이셨던 할머니. 어쩌면 그리도 화 한 번을 안 내셨을까. 내 자식이어도 그렇게는 못 하리라. 그래서일까. 목양실 한가운데 자리 잡은 의자를 볼 때마다 심장이 간질간질하다.
오래 묵은 청록빛깔 헝겊 의자에는 할머니가 사신 삶이 고스란히 묻어있다. 할머니는 세 아들을 먼저 가슴에 묻으셨다. 아들 다섯에 딸 셋이 있었는데, 둘째 삼촌은 내가 태어나기 전인 1980년도에 청소년축구 국가대표 경기를 보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단다. 그리고 내가 중학생 때 막둥이 삼촌이 돌아가셨다. 춘남이 삼촌은 내가 제일 좋아하고 따르던 영웅이었다. 오프로드 오토바이 뒷자리에 나를 태우고 거칠게 질주하던 마초이자 조기축구회의 호날두였다.
그렇게 건강하던 춘남이 삼촌은 위암으로 암 투병을 하다가 삼십 후반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다섯 살, 세 살배기 아들을 두고. 할머니는 큰 충격을 받으셨다. 어머니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자리를 채우시겠다고 교회에 처음 나오셨는데, 막둥이 데려갔다고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다. 나도 할머니와 같은 마음이었다. 춘남이 삼촌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줘서 뿔이 높이 솟았다.
할머니는 영원히 교회에 안 나올 것같이 하시더니 한 달 뒤, 다시 교회에 나오셨다. 할머니가 어느 날 주무시다가 잠결에 잠깐 눈을 떴는데, 누가 활짝 웃는 얼굴로 쳐다보더란다. ‘누구요?’라고 물었더니, ‘누구긴 누구야, 막둥이지’라고 했단다. 세상과 담을 쌓으려는 할머니를 구하려고 하나님이 춘남이 삼촌을 보내셨나 보다. 할머니 덕분에 하나님을 향한 내 미움도 걷혔다.
세 번째 가슴에 묻은 아들은 셋째 춘길이 삼촌이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큰 집 주인 노릇은 큰외숙모가 하셨다. 어지간히 눈칫밥을 주셨는지 외할머니는 혼자 사는 춘길이 삼촌 집으로 가셨다. 춘길이 삼촌은 어렸을 때부터 뇌전증이 있어서 간혹 길가에 쓰러져 발작을 일으키곤 했다. 병 때문에 이혼하고 혼자 산지 여러 해. 할머니는 아픈 손가락인 춘길이 삼촌 집에 함께 살면서 셋째 아들을 돌보는 낙으로 사셨다. 그런데, 춘길이 삼촌도 갑자기 돌아가셨다.
어느 날 아침, 기척 없는 춘길이 삼촌을 보고 맨발로 뛰쳐나가 동네방네 만나는 사람마다 도움을 요청하며 다녔다고 한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우리 아들이 갑자기 차갑게 굳어 숨을 안 쉰다고. 셋째 아들마저 가슴에 묻은 뒤 할머니는 다시 큰 집, 아니 할머니댁으로 되돌아가셨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는 ‘어르신 유치원’이라고 하는 주간보호센터에 매일 오고 가셨다.
어머니와 함께 할머니를 찾아뵙던 날, 할머니 오른쪽 팔다리에 깁스가 되어있었다. 얼굴 한쪽도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맞은 것처럼. 할머니는 “아야.” 하면서 아기 목소리로 아픈 신음을 하셨다. 큰외숙모는 주간보호센터에서 넘어졌다고 했다. 속이 뒤집힌 어머니는 당장 할머니를 집으로 모셔가려고 했다. 하지만 치매 증상이 있던 할머니는 거절하셨다. 죽어도 아들 집에 있겠다고 고집을 부리셨다. 어머니는 쓸개에서 신맛이 올라왔다. 아들이 뭐라고.
어머니는 큰이모, 작은이모와 함께 할머니를 모시고 오는 작전을 짰다. 서울에 사는 큰이모가 할머니를 설득했다. 결국, 할머니는 큰 집에서 나와 낯선 땅 경남 함양군에 있는 막내딸 집으로 이사하셨다. 이삿짐은 몸과 옷가지 몇 개가 전부였다.
할머니는 그동안 정신적인 충격이 크셨는지 치매 증상이 심했다. 어머니는 알아봤지만 나와 아버지는 못 알아보시고, 가끔 낯선 사람 보듯 깜짝깜짝 놀라셨다. 나를 볼 때마다 “누구요?”라고 물으셨다. “아따, 할머니. 손주여 손주, 춘옥이 아들!”이라고 대답하면, 항상 “허허허, 이잉.”하고 너털웃음을 지으셨다. 살아오신 세월만큼이나 다친 뼈는 회복하는 시간이 더뎠다. 주일마다 예배하러 교회로 모실 때 휠체어에 태워 갔다. 계단을 오를 때는 휠체어에서 할머니를 업어 모셨는데, 너무 가벼웠다. 더 이상 손주 밥 먹일 때 쫓아오던 덩치 큰 술래가 아니었다.
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달인 사랑의 약이 할머니가 받은 상처를 치료했다. 얼굴이 점점 환해지셨다. 건강을 회복하시면서 음식도 가리지 않고 잘 드셨다. 할머니는 양념통닭을 제일 좋아하셨다. 할머니와 양념통닭을 먹으며 드라마를 보다 보면 닭고기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른다. 드라마에서 나쁜 며느리가 나오면 ‘저 썩을 년’, ‘오메, 염병헐 년’, ‘호랭이가 물어갈 년’하고 욕을 하시는데, 욕이 어찌나 찰진지 통닭 맛이 백배 맛깔 난다. 할머니가 구수하게 욕을 하실 때마다, “아이참 할머니.”라고 하면 껄껄껄 숨이 넘어가라 웃으셨다.
할머니는 구순에 우리 곁을 떠나셨다. 외할머니는 끝끝내 날 볼 때마다 “누구요?”, “아따, 할머니. 춘옥이 아들!” 해야 나를 기억하셨다. 어머니는 후회 없이 엄마를 하늘나라로 보내셨다. 외할머니가 떠나신 후 어머니가 나지막이 한 말 한마디가 내 심장에 박혔다.
“이제 엄마는 아빠 엄마가 모두 없네.”
엄마 아빠가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나는 알 길이 없다. 그저 목양실에 덩그러니 남겨진, 외할머니가 앉으셨던 청록빛깔 헝겊 의자를 보며 어머니 마음을 가늠할 뿐.
여전히 외할머니는 어머니 곁에 계신다. 그리고 내 곁에도 있다. 금방이라도 “누구요?”라고 물을 것 같다. 어머니 책장 한 칸에 외할머니를 가운데 두고 오른쪽에 아롱이, 왼쪽에 어머니가 양쪽에서 할머니 팔짱을 끼고 활짝 미소 짓는 사진 한 장이 놓여 있다.
청록빛 헝겊 의자에 할머니가 여전히 앉아 계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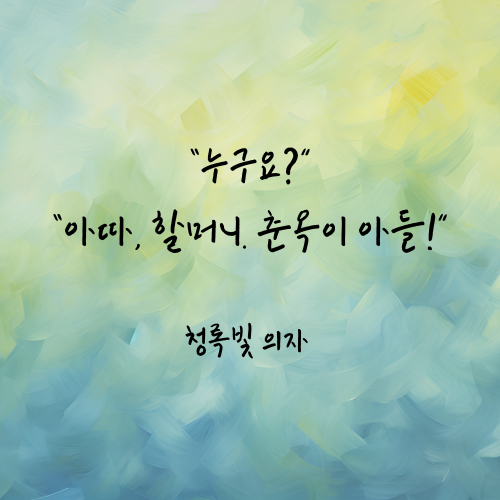




댓글